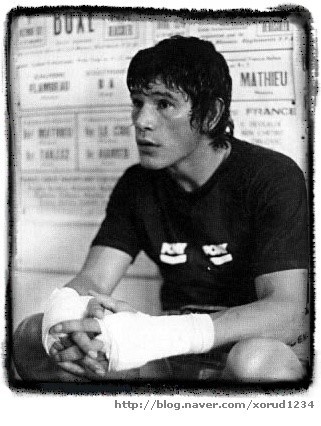이유 없는 감금(監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7년 전 감금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그때도 지금처럼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이 겨울을 재촉하며 늦가을을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아침 A씨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업무 생각에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허겁지겁 복장을 갖춰 차에 올라 쏜살같이 사무실로 향했다. 입구에서 인사 하던 직원들을 본체만체 지나 자신의 자리로 가 서류철을 꺼내 현장에 갈 준비를 한다.
간단하게 아침 미팅을 하고 부하 직원과 함께 차에 몸을 실었다. 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네 군데 현장을 다 돌고 날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서산을 바라보니 가을해도 어느 듯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A씨는 물한 잔 마실 틈도 없이 곧바로 서류정리에 들어갔다. 저녁약속이 있어 손놀림은 평상시보다 2배는 더 빨랐다.
약속시간 10분 전이었다. A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두 손을 모아 안도의 기지개를 켠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의 전광석화 같은 업무 능력에 감탄한다. 그렇게 A씨는 전쟁 같은 하루 일과를 보내고 몸은 지쳤지만 약속 장소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사무실 인근 횟집에 도착하니 먼저 온 술꾼들이 환하게 맞아준다. 그들은 20년 이상의 술 동지들이였다. 무슨 절차가 필요하겠는가. 각자 방바닥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흰소리 개소리 섞어 가며 술잔을 기우린다. 두 시간여가 지날 무렵 그들은 조용히 일어나 계산을 하고 근처 노래주점으로 향했다. 굳이 계획하지 않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어울러 뭉쳐 갔다. 물론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다. 그들 세계가 원래 그러했다.
주점에 도착한 무리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소맥 폭탄주를 타는 사람, 노래를 선곡하는 사람, 계산대에 가 단가를 협상하는 사람 등 그들은 고도로 분업화 된 탄탄한 조직이었다. 붓고 마시고 노래하는 사이 A씨는 지쳐가고 있었다. 고단한 몸으로 너무 달린 결과 과부하가 걸린 것이었다. 그는 결코 술 맷집이 약하지 않았지만 그 날만은 그랬다.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즈음 A씨는 슬그머니 그 방에서 나와 비어 있는 옆방으로 들어간다. 그의 생각에 조금 자면 에너지가 복구 되리라고 믿고 소파에 몸을 대자로 뻗어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A씨는 목이 타 물을 마시려고 눈을 뜬다. 사방이 칠흑처럼 깜깜했다. 수 초간 멍하니 있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라이터를 꺼냈다. 불을 켜자 주변이 눈에 들어온다. 천정을 바라본다.
집이 아니었다. 머리는 띵하고 입에서는 신물이 올라왔다. 잠시 석고상처럼 굳어 있다 머릿속에서 되감기를 반복한다. 상황파악이 대충 끝난 A씨는 피를 토하듯 뱉어낸다. “니기미, 망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한다. 선명하게 1초도 틀리지 않고 새벽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를 악물며 먼저 간 무리들, 자신을 내팽겨 치고 간데 대해 신음처럼 저주를 토해낸다.
“이런, 가이스키들.”
바깥에 나간 정신 줄을 다시 끌어 들인 A씨는 촌각이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입구 쪽으로 더듬거리며 몸을 옮긴다. 입구에 도착한 A씨는 문을 밀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라이터 불을 올려 자세하게 바라보던 A씨는 작은 눈이 방울만큼 커진다.
“아! XX, 진짜 망했다.”
셔터문이 철옹성처럼 내려가 있었다. 그는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며 바닥에 주저앉는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 그는 이 재난상황을 어디에서부터 수습해야 할지를 고민한다. 먼저 119를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이 상황이 보도 자료라도 소방서에서 나가면…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또 한참을 멍 때린 A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무리들에게 전화를 건다. 받는 놈이 한 명도 없었다, A씨는 절망했다. 또 한참이 지났다.
그가 다시 폰을 집는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1를 누른다. 다시 1를 누른다. 마지막 9로 다가가던 손가락을 황급히 접는다. 그리곤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건다. 한참의 신호음이 가다 상대편 저 너머에서 구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잠이 들깨 짜증나고 쉰 목소리였지만 A씨에게는 천상의 소리이자 전지전능한 신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나 좀 꺼내도, 칩고 무섭고 미치것다.”
그가 전화한 상대는 직장동료이자 지금 감금당한 가계 주인과 먼 친척이었다. 그로부터 30여 분이 지나자 새벽의 적막을 깨고 셔터문이 힘차게 올라가고 있었다. A씨의 작은 눈망울에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아! 살았다.”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