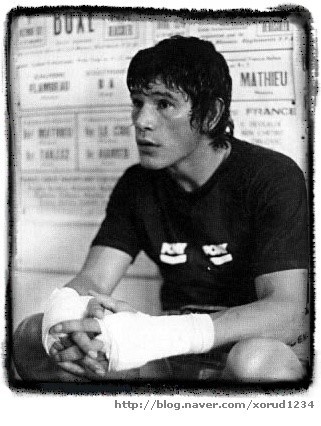[거제만사] 돌에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의 심리
“돌 깎아 성명을 써 놓았더니, 산 스님 웃음이 그치질 않네, 천지도 하나의 물거품이거늘, 얼마나 그 이름을 남길 수 있겠소”
돌에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비판한 한시(漢詩)를 해석한 내용이다.
거제시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는 거제식물원(일명 정글돔)을 지난 1월17일 준공하면서 이를 기념하는 표지석(150cm×100cm)을 수십만 원을 들여 입구에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지석의 ‘만든 사람 란’에 관계 공무원의 이름까지 새겨 넣었다가 입방아에 오르자 급기야 지난 3월초 이름을 깎아내는 촌극을 벌였다는 소식이다. 시대착오적 발상에 헛웃음이 나온다.
새겨진 이름을 지우니 흠이 남아 보는 이에게 의구심을 안겨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거제시의 관계공무원은“(이 식물원)의 사후관리와 행정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이름을 새겼다고 해명했다.
행정이 그토록 책임의지를 나타내고 싶었다면 표지석의 뒷면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굳이 담당과장과 계장, 주무관의 이름까지 새겨 넣어야 했을까. 그래야만 책임감이 샘솟는가. 돌은 긴 세월을 견뎌내는 무생물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데 말이다. 간단히 말해 이름이 새겨진 관계공무원이 천년만년 그 업무를 보는가. “책임소재” 운운하는 관계공무원의 말은 어찌 앞뒤가 안 맞다. 옹색한 변명이다.
유리로 외관을 마무리한 독특한 모양의 이 식물원은 전김한겸 시장과 권민호 시장을 거쳐 현재 시장에 이르러 완공됐다.
몇년의 기간 동안 두 사람의 시장을 거쳤고 2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공로가 묻어 있었다. 준공시기에 관계했다고 그 공을 독차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다가 표지석에 이름까지 새겼다면 오늘의 이 식물원이 있기까지 열정을 다하고 사라져간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하겠는가.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를 쓴 유홍준 전 문화재창장은 박정희 시절에 지리산에 맞지 않는 긴 칼 모양의 조형물을 보면서 이 책에서 “저 놈의 준공탑만 보면 피가 끓는다”고 일갈했다.
이 식물원 준공에 ‘국물’이 조금 튀었다고 표지석에 이름까지 새겨야 된다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 시민들이 이 놈의 표지석만 보면 피가 끓지 않아야 할 터인데...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